사업보고 게시글
박길종 디자이너의 Space Oddity
2019.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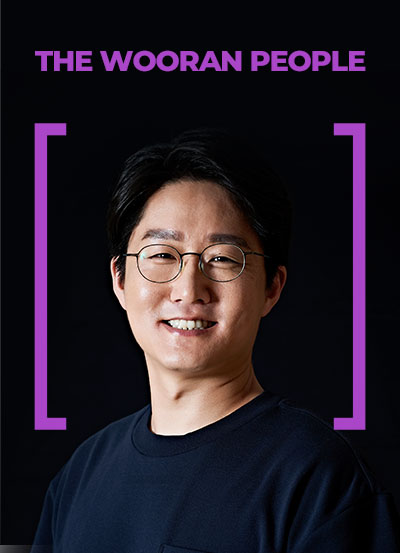
우란문화재단 X 길종상가 만나다
종이도 예술이 될 수 있나요? 우란문화재단 우란시선 기획전시 <신물지(神物紙)>는 ‘신성한 물건, 한지’라는 뜻으로 한지 공예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우란1경에서 6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시 공간은 밝고 산뜻하며 때때로 유쾌하고 귀엽게도 느껴진다. 초월적이며 정신적인 세계를 다루는 전시 주제를 이토록 매끄럽고 유연하게 풀어낸 사람은 누구일까? 요즘 핫한 공간 혹은 프로젝트에서 종종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그룹 길종상가의 박길종을 을지로에서 만났다.
길종상가 그리고 박가공은 누구인가?
에르메스 쇼윈도를 독특한 발상의 아이디어로 꾸미는 프로젝트는 길종상가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다. 일종의 크루 개념으로 모인 길종상가는 2010년 결성된 이래로 디자인계와 미술계를 누비며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 그리고 길종상가의 일원이며 평소 ‘박가공’이라는 가명으로도 활동하는 박길종은 상업과 비상업적인 프로젝트의 경계 사이에서 오브제와 가구 제작부터 범위가 넓은 공간 디자인 작업까지 다채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길종상가는 원래 공동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박가공이란 또 다른 이름을 만들었어요. 박가공은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고 물건을 가공한다는 뜻도 있죠. 처음에는 역할놀이처럼 재미있게 사용하다가 지금은 박길종, 가공 씨, 가공 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스펙트럼은 정말로 넓고 흥미롭다. 어느 누군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작가처럼 생각하고 발명가처럼 만들며 목수처럼 일하는 예술가’라고 말이다. 그가 만드는 오브제와 가구는 관찰의 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한동안 홈페이지에 사진관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바라봤던 건축적인 풍경, 길에 버려진 의자, 그것을 재미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길을 걸으면서 재미있거나 독특한 것을 발견하면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오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사이를 고민한 공간 디자인
종이로 시작해 종이로 끝나는 실험적이고 독특한 소재와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박길종 디자이너는 ‘CONST-‘의 김재환 소장과 함께 전시 공간의 디자인, 제작, 설치를 맡았다. “처음 전시 공간 디자인을 의뢰받고 전시에 참여하는 장인들의 작업실, 그분들이 만든 결과물이 담긴 자료집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나름의 해석을 시도했어요. 다루기 무거울 수 있는 주제와 소재이기에 박물관처럼 딱딱해 보이지 않도록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종이 외에 다른 재료, 이를테면 반투명한 아크릴과 금속 재료로 통일감을 주고 공간이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팔각형처럼 각진 형태의 오브제를 구상했어요. 컬러 역시도 붉은색과 흰색 두 가지 컬러만 사용했고요.”이번 전시는 불교 의식을 위해 제작한 종이로 만든 꽃인 지화부터 제주 전통 신앙에서 무구(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던 기메까지, 역사와 전통 속에 존재해왔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새로운 한지의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비밀스럽고 신성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끈다.
평면 예술과 입체적인 오브제의 만남
<신물지>는 입구부터 인상적인 전시다. 파란 병풍 사이로 안내 데스크가 숨어있고, 비밀스러운 통로를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저 멀리 우뚝 솟아 있는 8개의 단상이 눈에 들어온다.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한지로 만든 전통 작품은 묘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천장을 바라보면 한지로 섬세하게 제작한 샹들리에 형상의 한지 공예품이 주렁주렁 걸려있기도 하다. 접어 오려서 반복된 형상과 섬세한 패턴으로 완성한 공예적 특징의 작품은 마치 런웨이의 오트쿠튀르 의상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넘친다. 한지를 접어 칼로 오려내 패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과 섬세한 내공을 필요로 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재선 법사(설위설경), 김영철 심방(기메), 정용재 장인(지화) 등 과거의 기억과 전통을 복원하며 지켜오는 사람들을 재조명한다. 박길종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종이, 한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차제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지화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흉내도 못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연관된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충청남도, 동해안 지역, 제주도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한지 공예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디테일은 나의 힘
전시장 곳곳을 걸어보며 박길종 디자이너가 설계한 하이라이트 구간을 탐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장인들의 작품 과정과 이들이 행하는 전통의례 과정을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흥미로웠던 작품은 이유지아 작가의 영상 설치 작품 ‘와해경(瓦解經)– 떠다니는 그림자’이다. 박길종 디자이너는 이 작품의 보는 방식과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마치 삼면화처럼 3개의 영상으로 연결된 작품을 관람객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글루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동그란 형상 안으로 쏙 들어가 방석 위에 앉아 작품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종이는 그 어떤 것보다 섬세한 물성의 재료다. 쉽게 찢거나 오릴 수 있으며 바람에도 가볍게 휘날린다. 작품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전시장에는 디테일의 힘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최대한 종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했고 접착제가 잘 보이지 않도록 작은 자석을 사용해서 붙이기도 했죠. 지화를 꽂을 때도 구멍을 타이트하게 뚫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 각자의 신성한 물건
박길종의 생각과 터치가 닿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위트 있는 무언가 탄생한다. 그렇기에 그가 만들 미래의 물건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든다. 다가올 가을에 그는 한글을 모티브로 무언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글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한글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가구에 가까운 물체 몇 개를 만들어서 거실 라운지처럼 조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길에서 채집한 이름 모를 사물과 사람들에게 영감을 얻고 의뢰자와의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이전에 없던 독특한 오브제와 가구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박길종. 마지막으로 혹시 그에게도 신성한 물건이 있을지 물었다. “신성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종교적인 신성함과는 다르게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물건을 신성하다고 표현한다면,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 구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종이, 펜, 연필 등 이런 물건이 오히려 저에겐 신성한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ㅡ
글: 김아름
사진: 황인철



